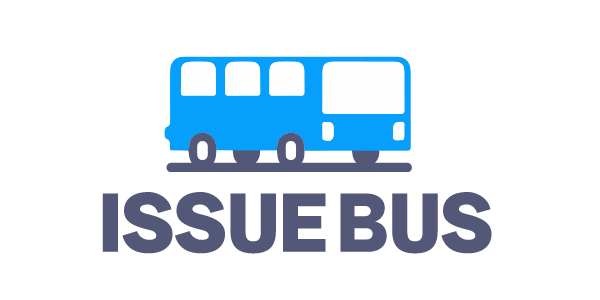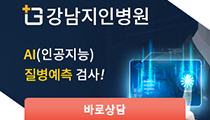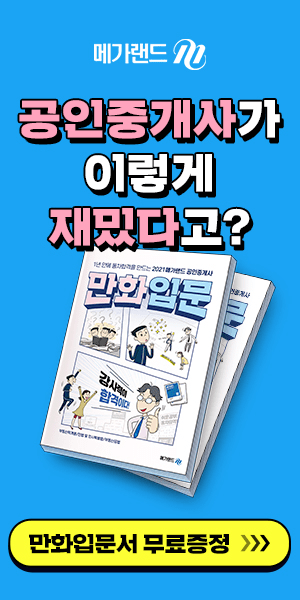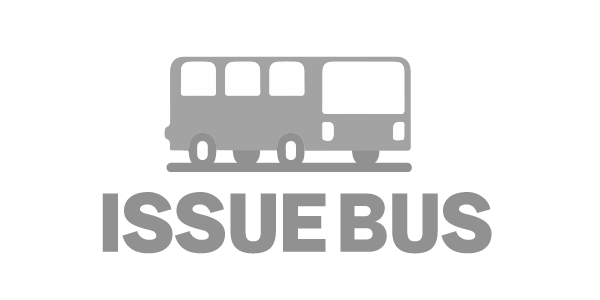쓰개치마 아래 뒤바뀐 운명…'춘향단전', 그날 밤의 입맞춤이 모든 걸 바꿨다
 고전소설 '춘향전'이 품고 있던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춘향과 몽룡, 변학도의 삼각관계라는 익숙한 구도를 넘어, 춘향의 몸종 향단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파격적인 시도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춘향단전'은 제목에서부터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붉을 단(丹) 자를 더해 춘향의 그늘에 가려졌던 향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원작보다 한층 더 격정적이고 붉은 사랑을 그리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모든 비극은 이몽룡이 춘향의 쓰개치마를 쓴 향단을 춘향으로 착각해 입을 맞추는 순간 시작된다. 이 한 번의 입맞춤은 향단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불씨를 지핀다.
고전소설 '춘향전'이 품고 있던 또 다른 사랑의 가능성이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춘향과 몽룡, 변학도의 삼각관계라는 익숙한 구도를 넘어, 춘향의 몸종 향단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는 파격적인 시도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춘향단전'은 제목에서부터 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낸다. 붉을 단(丹) 자를 더해 춘향의 그늘에 가려졌던 향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원작보다 한층 더 격정적이고 붉은 사랑을 그리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모든 비극은 이몽룡이 춘향의 쓰개치마를 쓴 향단을 춘향으로 착각해 입을 맞추는 순간 시작된다. 이 한 번의 입맞춤은 향단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불씨를 지핀다.원작에서 신분의 벽 앞에 서서 감히 몽룡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향단은 '춘향단전'에서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분출하는 인물로 재탄생한다. 몽룡을 향한 연모는 곧 주인 아씨인 춘향에 대한 질투로 변하고,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극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깊어져 광기 어린 집착으로 치닫는다. 연출을 맡은 김충한 예술감독은 이러한 향단의 변화가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극단적인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고전의 틀 안에 현대인의 복잡하고 뒤틀린 욕망을 투영하여 관객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갈등의 중심에도 불구하고, 춘향과 몽룡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원작의 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사랑은 향단의 질투와 집착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지며, 이는 향단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결국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향단은 사랑을 쟁취하기는커녕, 원작에서보다 훨씬 더 처연하고 고독한 인물로 남겨진다.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을 쟁취한 춘향의 이야기 뒤편에서, 신분의 벽을 넘고자 했으나 끝내 좌절하고 파멸하는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가 처절하게 그려지는 셈이다.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는 대사 한 마디 없는 무용극으로 펼쳐진다. 국립국악원 무용단원들은 한삼춤, 도열춤, 검무, 기생춤 등 다채로운 춤사위를 통해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특히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만든 주제가는 극의 비극성을 한층 고조시킨다. 정악단 단원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는 인물들의 애절한 마음, 특히 이별의 아픔을 절절하게 전달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광한루를 상징하는 다리 위에서 엇갈리는 인물들의 만남과 헤어짐은 춤과 음악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비극을 완성한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50대 부부 한알 먹고 침대에서 평균횟수 하루5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먹자마자 묵은변 콸콸! -7kg 똥뱃살 쫙빠져!
- 월3000만원 벌고 싶으면 "이 자격증"만 따면 된다.
- 인천 부평 집값 서울보다 비싸질것..이유는?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