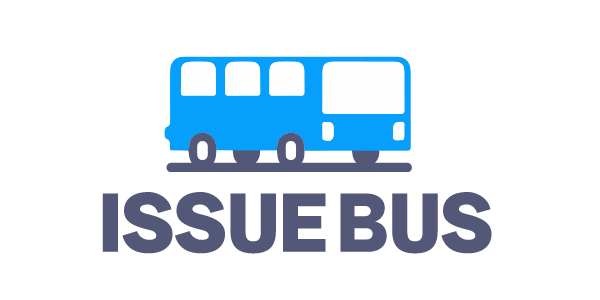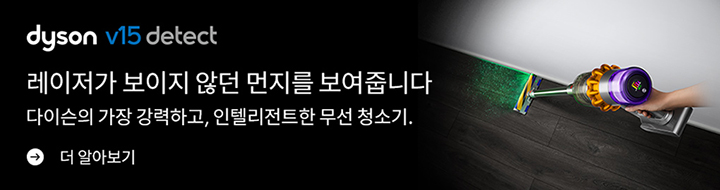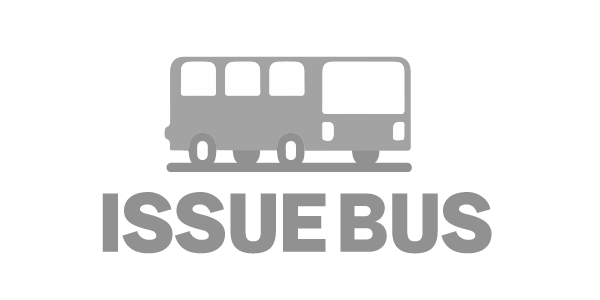어도어와 하이브, 경영권 논쟁 속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 재점화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 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확산하면서 뉴진스 표절 논란이 다시 한번 불붙고 있다. 하이브 측이 22일, 어도어의 수장인 민희진 대표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갈등이 심화하였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어도어가 하이브의 '뉴진스 베끼기'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 같은 발언은 어도어가 한 달 전부터 제기한 '뉴진스 표절' 문제를 묵과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탐지하고 감사권을 발동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요 주주로,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 표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가 파국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양사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난임 고생하다 폐경 후, '57세' 최고령 쌍둥이 출산?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부족한 머리숱,"두피문신"으로 채우세요! 글로웰의원 의)96837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월3천만원 수입 가져가는 '이 자격증' 지원자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