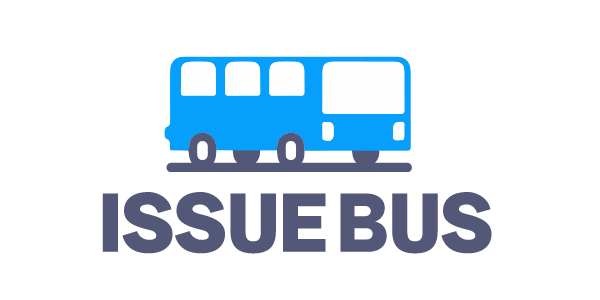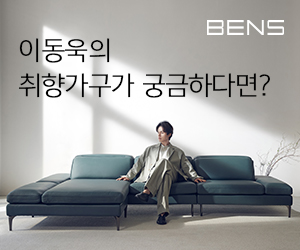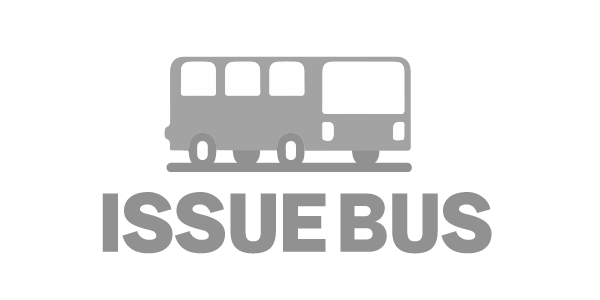'러 귀화' 빅토르 안, "러시아 쇼트트랙 상징"으로 칭송받아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빅토르 안(39·안현수)이 러시아에서 "쇼트트랙의 상징"으로 칭송받았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빅토르 안(39·안현수)이 러시아에서 "쇼트트랙의 상징"으로 칭송받았다. 러시아로 귀화한 뒤, 러시아 쇼트트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이다.러시아 타스 통신은 17일(현지시간), 니콜라이 굴랴예프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 쇼트트랙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빅토르 안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와 같이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굴랴예프 회장은 빅토르 안이 러시아 내 쇼트트랙의 인기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빅토르 안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러시아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준 순간을 회상했다. 빅토르 안은 소치 올림픽에서의 활약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는 등 러시아의 국민적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굴랴예프 회장은 이번 행사에 빅토르 안을 초청했으나, 개인적인 가족 문제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우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쇼트트랙을 알리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빅토르 안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빅토르 안은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이후,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의 일원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러시아 쇼트트랙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기술 코치를 역임하며 지도자로서의 역량도 보여주었다.
지난해, 빅토르 안은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하며 국내 복귀를 모색했으나, 아쉽게도 무산되었다. 그의 국내 복귀 불발은 당시 국내 스포츠계에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러시아 귀화 이후, 러시아 쇼트트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빅토르 안.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의 "상징"이라는 표현은 그의 업적과 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비록 이번 기념식에는 불참했지만, 빅토르 안은 여전히 러시아 쇼트트랙계에서 중요한 인물이자 존경받는 선수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