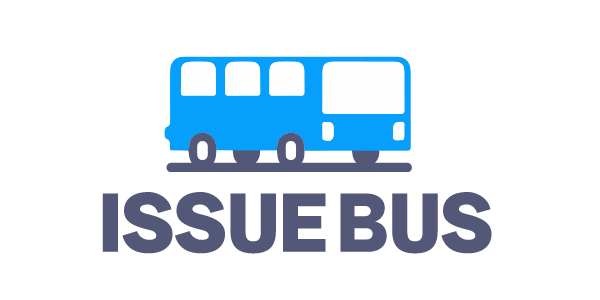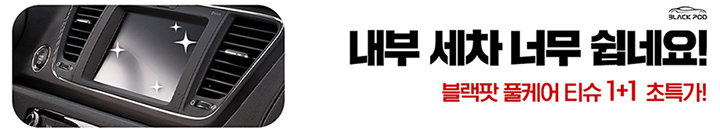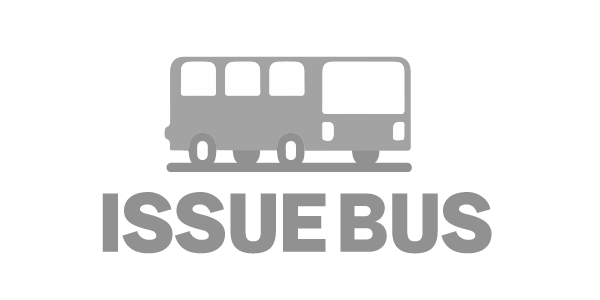세 번 숙청당하고 돌아와 중국 4100년의 굶주림을 끝낸 지도자
 1978년, 중국의 1인당 소득은 156달러에 불과한 절대 빈곤 국가였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 경이로운 '대굴기(大崛起)'의 중심에는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있었다. 그는 국가 주석이나 총리 같은 공식적인 최고 직책 없이, 오직 실용주의 리더십 하나로 중국 대륙을 천지개벽시켰다.
1978년, 중국의 1인당 소득은 156달러에 불과한 절대 빈곤 국가였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이 경이로운 '대굴기(大崛起)'의 중심에는 '작은 거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있었다. 그는 국가 주석이나 총리 같은 공식적인 최고 직책 없이, 오직 실용주의 리더십 하나로 중국 대륙을 천지개벽시켰다.덩샤오핑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삼전삼기(三顚三起)', 즉 세 번의 실각과 세 번의 복권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다. 마오쩌둥의 급진적인 정책에 반대하다 '우경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혔고,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로 몰려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공장으로 하방되는 수모를 겪었다. 평생의 정치적 동지였던 저우언라이의 사망 이후에는 '반당·반사회주의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세 번째 시련을 맞았다.
그러나 157cm의 작은 체구에 담긴 그의 정치적 생명력은 끈질겼다. 1977년, 73세의 나이로 세 번째 복권에 성공한 그는 1년 뒤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승부수를 던진다. 1978년 12월, 그는 '4개 현대화' 노선을 발표하며 개혁·개방 정책의 서막을 열었다. 그의 철학은 명료했다. "고양이 색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실용주의였다. 이념 논쟁으로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인민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었다.
개혁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됐다.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과감히 해체하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가정연산승포책임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를 가족 단위로 나누어 경작하고, 남는 생산물은 시장에 팔 수 있게 한 조치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1979년 시범 마을의 식량 생산량은 6배나 폭증했고, 1984년에는 중국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 10억 인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역사상 최초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농업의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선전, 주하이 등 4개의 '경제특구'를 설치해 자본주의 실험에 착수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하자, 인구 3만의 작은 어촌이었던 선전은 불과 10여 년 만에 100만 인구의 현대 도시로 탈바꿈했다.
1989년 톈안먼 사태와 1991년 소련 붕괴로 개혁·개방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88세의 노정객은 다시 한번 직접 나섰다. 1992년 남부 지역을 순회하며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남순강화(南巡講話)'는 보수파의 저항을 잠재우고 중국 경제가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내세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구호다. 필자의 지적처럼, 이는 '네모난 원'과 같은 형용모순이다.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라는 금기어를 피하고 만들어낸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본질은 사유재산과 경쟁을 도입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덩샤오핑은 공산주의라는 껍데기는 유지하되, 그 안의 내용물은 자본주의로 채워 부유하고 강력한 중국을 만드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속임수야말로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BEST 머니이슈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
- 로또 972회 번호 6자리 몽땅 공개, "오늘만" 무료니까 꼭 오늘 확인하세요.
- 로또용지 찢지마세요. 97%이상이 모르는 비밀! "뒷면 비추면 번호 보인다!?"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한의사 김오곤 "2주 -17kg 감량법" 화제!
- “빚 없애라” 신용등급 상관없이 정부서 1억지원!